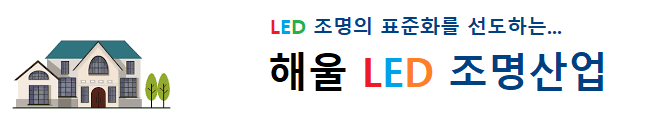여행후기 문경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오르는 주흘산, 그리고 문경새재길...
페이지 정보
본문
문경 새재...
‘문경새재 물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 홍두깨 방망이 팔자 좋아 / 큰 아기 손질에 놀아난다 / 문경새재 넘어갈 제 / 굽이야 굽이야 눈물이 난다.’
문경새재아리랑을 흥얼거리며 고개를 넘는다.
문경새재아리랑은 노랫말에 담긴 문경새재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새재 고갯마루를 오르다 보면 문경새재 아리랑비가 있다.
새재(하늘재)는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신라 아달라왕 3년, 156년) 최초의 도로다.
삼국시대엔 중원의 거점이었고 고려시대 홍건적 침입 땐 국방의 보루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로이자 군사적 요충지다.
이 고개를 사이로 희양산, 대야산, 조령산, 신선봉, 월악산 등이 좌우에서 마주보고 있다.
이 틈새에서 주변을 아우르며 수문장 구실을 하고 있는 산이 있으니 주흘산이다.
주흘산의 흘(屹)은 '산 우뚝 솟을 흘'. 이름처럼 영남의 관문에 우뚝 서 새재를 굽어보며 주산(主山)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소백산~죽령을 달려온 백두대간은 북으로 월악산을, 남으로 조령산을 솟구쳐 올렸다.
이 대간길을 살짝 비켜서 남으로 길게 뻗은 산이 있으니 주흘산이다.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등뼈라면 길은 혈관이다.
그 중 동맥격인 새재는 한양으로 향하던 교통로 중 가장 높고 험한 구간이다.
보부상들과 마차들이 넘던 물산의 교류 길이었고 영남과 기호(畿湖) 학맥을 이어주던 지적(知的) 소통로였다.
왜 새재였을까.
가장 높고 험준한 이곳이 최고의 교통로로 부상한 이유는?
첫째, 부산에서 한강 뱃길로 통하는 최단거리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조선시대 물자와 조운의 주된 수송은 뱃길이었고 이 길을 통해 충주~남한강을 거쳐 곧장 서울로 통할 수 있었다.
둘째, 전시에 천혜의 요새로의 쓰임이었다.
새재는 임진왜란 때 남해 해상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저지선이었다.
이런 교통, 수송, 국방상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새재는 일찍부터 민족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주흘산엔 역사와 지리적 자랑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 자체로도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들어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단풍으로 치장한 가을엔 새재의 풍취와 오색 미감에 빠지려는 산객들이 전국에서 몰려든다.
등산로는 들머리에 따라 10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으나, 1관문-여궁폭포-대궐터-주봉(정상)에서 꽃밭서들로 내려오거나 영봉으로 연결해 부봉으로 내달려 2관문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일행은 조령천을 원색으로 물들인 가로수들을 사열하며 주봉을 향해 오른다.
제일 먼저 오색 단풍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를 뿌리는 여궁폭포가 일행을 맞는다.
약 20m의 높이에서 끌로 판 듯 좁게 팬 홈으로 맑은 물이 쏟아진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여성의 하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
◆고려말 홍건적 침입 때 공민왕 피난처
시원한 계곡을 따라 1시간쯤 오르면 혜국사가 나온다.
고려 말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이 이곳에서 피난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땐 서산 대사 휘하의 승병들이 크게 공을 세워 조정으로부터 혜국사(나라에 은혜를 베푼 절)라는 이름을 얻었다.
30분 거리에 있는 대궐 터는 공민왕이 행재소(임시대궐터)를 지어 집무를 보던 곳. 900고지 산악지대에 이런 평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규모로 펼쳐져 있다.
길 옆에는 당시 성안사람들의 목을 축여 주었을 대궐샘이 600년 세월을 넘어 지금도 기운차게 흐른다.
대궐샘에서 식수를 보충하고 주봉으로 오른다.
옛날 왕이 파발을 기다렸다는 전좌문을 지나 드디어 주봉 정상(1,075m)에 선다.
수십 길 벼랑 아래로 작은 능선들이 원색의 물결로 일렁인다.
그 오색카펫 끝자락에 문경시내가 살짝 내려앉은 듯 걸쳐 있다.
정상에서 좌우를 돌아보니 밑에서 보던 것과 달리 웅산의 면모가 느껴진다.
정상 등정의 성취가 식욕으로 이어진 듯 주봉엔 오찬을 즐기는 등산객들의 수다가 요란하다.
주봉에서 왼쪽을 바로 내려서면 야생화와 바위언덕(서들)이 조화를 이룬 꽃밭서들로 이어지고 능선을 끼고 쭉 나가면 영봉과 만난다.
영봉은 해발 1,106m로 주봉보다 30m가 높다.
그럼에도 조망과 산세가 뒤진다는 이유로 주봉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산에 무슨 우열이 있겠냐마는 영봉의 비운에서 인간에 의해 재단된 산의 슬픔이 느껴진다.
영봉에서는 꽃밭서들로 탈출할지 부봉까지 내달을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준족에 모험심이 많은 산꾼이라면 부봉 등정에 도전해볼 만하다.
부봉은 조곡관 뒤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산. 6개의 암봉이 마치 가마솥(釜)을 엎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6개 암봉의 스릴 있는 배열, 부봉
부봉은 급경사의 철계단, 로프의 연속이다.
또 곳곳에 벼랑이 널려 있어 실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악천후나 겨울철엔 등정을 삼가는 것이 좋다. 어렵고 위험한 등정을 완수하면 대신 멋진 조망과 산세가 기다린다.
유감스럽게도 산에서는 모두가 후불제다.
오른 자, 위험을 무릅쓴 자에게만 산은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부봉에서 조곡관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윽한 숲길을 따라 내려오다 물소리가 들리면 바로 제2관문이다.
이제 반가운 평지길. 급경사, 바위에 지친 발을 쉬게 하고 눈과 귀를 연다.
새재 유적을 따라 문화해설사들이 역사 강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시대 공익캠페인의 현장인 '산불됴심비'부터 옛 감찰사 이'취임식이 열리던 교구정과 관리들의 숙박시설인 조령원 터가 차례로 나온다.
새재에서 등산객들은 누구나 보부상도 되고, 서류뭉치를 나르는 역졸도 되고 과거 길에 나선 선비도 상상해 본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물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시차를 넘어 사고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주변이 어수선해진다.
길 끝자락에서 화려한 궁중 복장을 한 사람들이 고갯길을 올라온다.
가장 행렬인가?
조령관 문지기 교대식인가?
뜻밖의 풍경에 시공(時空)이 혼돈스러워진다.
그때 옆에서 들리는 한마디에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쟤 완전 화장발이네." "와! 인기가요 MC오빠다!"
그렇다. 그들의 행선지는 드라마 세트장이었다.
◆먹을거리=새재왕건집(산나물정식'도토리묵채밥'문경약돌돼지고기, 054-571-8837) 새재할매집(한식, 571-5600), 새재초곡관식당(한식'청국장, 571-2320) 소문난집(청포묵조밥'도토리묵조밥, 572-2255)
◆교통=경부고속도로 김천 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접어들어 문경새재IC에서 내려 좌회전, 3번 국도를 따라 5분 정도 가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빠지면 문경새재도립공원 가는 이정표가 나온다. 10분쯤 달리면 문경새재 주흘관 입구 주차장에 닿는다.
◆숙박=문경관광호텔(571-8001), 문경새재유스호스텔(571-5533), 동화원산장(571-2554), 목련가든(572-1940)
- 이전글제주 중문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주상절리의 멋진 풍광... 24.07.15
- 다음글밤하늘의 별빛과 광활한 대지를 말을 타고 달려 볼 수 있는 대륙의 여행지, 몽골 여행.. 24.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유네스코 (UNESCO)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성산일출…
해울그룹 2025-04-17
유네스코 (UNESCO)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성산일출…
해울그룹 2025-04-17
-
 연분홍 진달래꽃 만발한 경남 창녕 화왕산..
해울그룹 2025-04-07
연분홍 진달래꽃 만발한 경남 창녕 화왕산..
해울그룹 2025-04-07
-
 대구 비슬산 진달래, 해발 1,000m 고지에 펼쳐지는…
해울그룹 2025-04-07
대구 비슬산 진달래, 해발 1,000m 고지에 펼쳐지는…
해울그룹 2025-04-07
-
 강릉시 푸른 동해바다 전망이 가능한 '세인트존스 호텔 …
해울그룹 2025-04-08
강릉시 푸른 동해바다 전망이 가능한 '세인트존스 호텔 …
해울그룹 2025-04-08
-
 대서양 카리브해 지상 낙원 바하마섬, 여행주의보 발령
해울그룹 2025-04-07
대서양 카리브해 지상 낙원 바하마섬, 여행주의보 발령
해울그룹 2025-04-07
-
 섬 전체가 벛꽃으로 물드는 진천 초평저수지 초평붕어마을…
해울그룹 2025-04-09
섬 전체가 벛꽃으로 물드는 진천 초평저수지 초평붕어마을…
해울그룹 2025-04-09
-
 전통의 온기를 품은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해울그룹 2025-04-09
전통의 온기를 품은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해울그룹 2025-04-09
-
 토속음식이 한자리에..강원도 정선 로컬푸드축제, 25∼…
해울그룹 2025-04-21
토속음식이 한자리에..강원도 정선 로컬푸드축제, 25∼…
해울그룹 2025-04-21
-
 유채꽃 흐드러진 경남 남해 두모마을과 가천마을 다랭이 …
해울그룹 2025-04-11
유채꽃 흐드러진 경남 남해 두모마을과 가천마을 다랭이 …
해울그룹 2025-04-11
-
 온양온천과 도고온천으로 널리 알려진 온천휴양지, 충남 …
해울그룹 2025-04-09
온양온천과 도고온천으로 널리 알려진 온천휴양지, 충남 …
해울그룹 2025-04-09